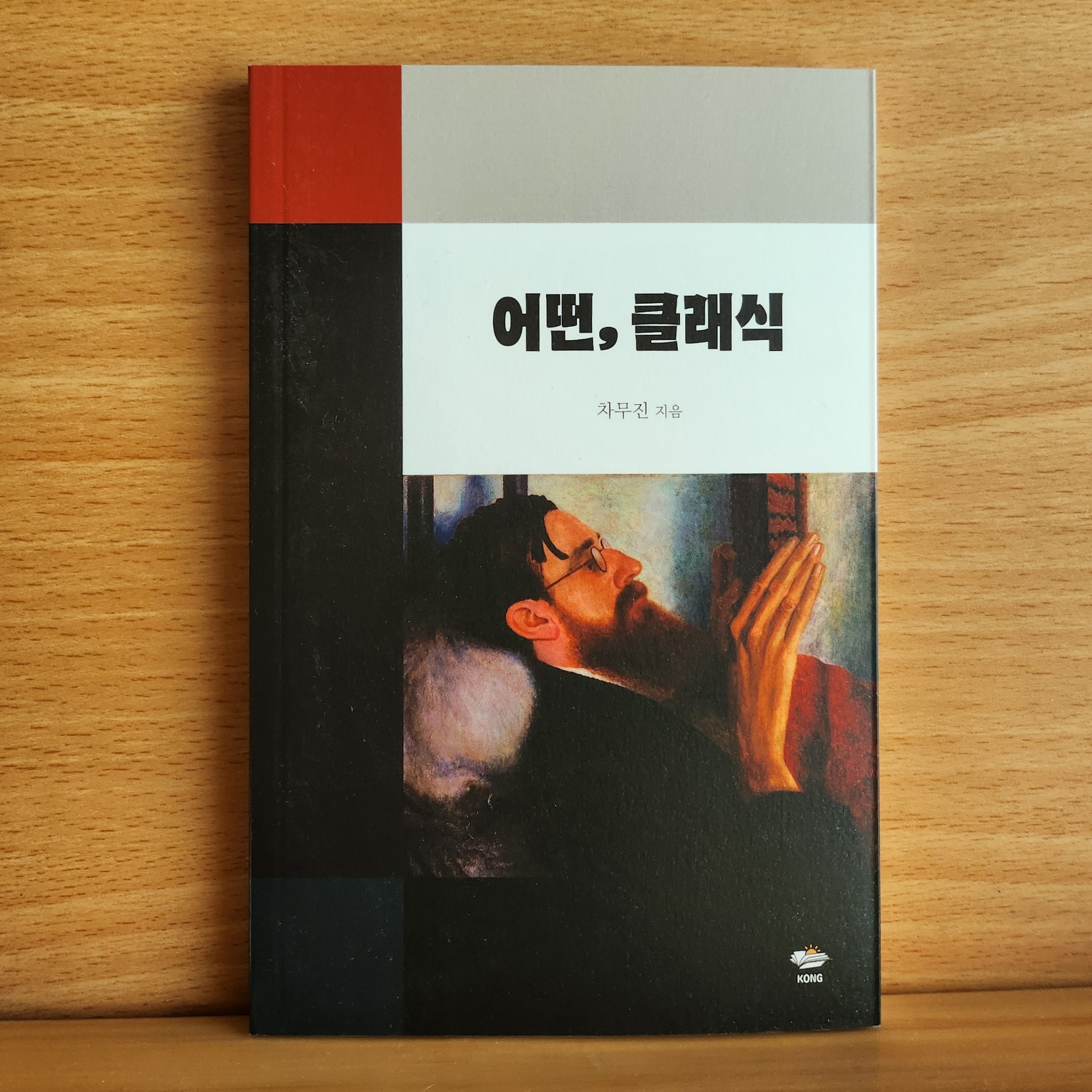
내가 클래식에 관해 아는 수준은 소박하다.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 베토벤 교향곡 9번, 파헬벨의 카논, 비발디의 사계 등 남들이 다 아는 정도를 알 뿐이다.
그런 나도 한때 꽤 즐겨듣던 클래식이 있는데, 바로 헨델이 오라토리오 '메시아'다.
'메시아'를 찾아 듣게 된 계기는 남들이 보기엔 어처구니없겠지만 영화 <첩혈쌍웅> 때문이다.
<쳡혈쌍웅>은 내가 지금까지 과장을 보태면 200번은 넘게 본 최애 영화인데, 그중에서 가장 명장면은 후반부의 총격 신이다.
주인공 두 명을 죽이려고 성당에 처들어온 악당이 성모 마리아상을 총으로 쏴서 부술 때, 절망하는 두 주인공의 클로즈업된 표정 위로 비장한 음악이 흐른다.
신시사이저가 연주하는 처연한 멜로디의 정체를 알아보니 '메시아'의 서곡 '신포니아'였다.
신이 필요한데 신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흐르는 멜로디가 '메시아'의 서곡이라는 아이러니.
내게 '메시아'는 2부의 합창곡 '할렐루야'보다 서곡 '신포니아'가 더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이 산문집에 작가가 실은 이야기는 대체로 내가 경험했던 '메시아'에 관한 기억과 맥을 같이 한다.
이 산문집 속 클래식은 대부분 잘 알려진 곡들인데, 곡들에 관한 얽힌 사연은 무척 개인적이어서 진솔하고 흥미롭다.
폭우 속에서 옛 애인을 떠올리며 비탈리의 '샤콘느'를 소환하고, 겨울에 겪는 우울을 고백하며 쇼팽의 '녹턴'과 차이코프스키의 '비창'의 뒷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새벽부터 순두부와 반주를 하려는 다급한 발길을 묘사할 땐 기가 막히게도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기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온다.
작가의 대표작인 장편소설 <인 더 백>에 관한 사연에 곁들여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를 소개할 땐, 맡아보지도 못한 아들의 머리 냄새가 느껴져 코끝이 시큰해진다.
작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클래식은 고상한 음악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작가의 문장을 빌려 말하자면 "돈 많은 자가 비싼 진공관 앰프로도 들을 수 있고, 가난한 자가 낡은 고무줄 둘둘 묶은 손 라디오로도 들을 수 있으며, 젊은이가 이어폰으로도, 어린이가 음악실에서도 들을 수 있"는 게 클래식이다.
작가는 자신의 부끄러웠던 경험을 들어 베토벤을 열심히 듣는다고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건 아니라고, 답이 보이지 않았던 시절에 들었던 말러의 교향곡 제5번이 왜 좋은지 모르겠다고 고백하기도 한다.
이 얼마나 솔직한 태도인가.
이 산문집은 클래식에 관한 위대함이나 들어야 하는 이유에 관해선 말하지 않는다.
좋아하는 음악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관한 이야기다.
왜 사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딱히 할 말이 없지 않은가.
베토벤이 현악 사중주 14번에 적은 문구인 '쉬지 않고 연주하라'처럼 그저 살아 있으니 최선을 다해 살고자 애를 쓰는 거지.
그러다 보면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는 거지.
'독서 후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대건 장편소설 <급류>(민음사) (0) | 2024.04.28 |
|---|---|
| 김하율 장편소설 <어쩌다 노산>(은행나무) (0) | 2024.04.25 |
| 김보영 연작소설 <종의 기원담>(아작) (0) | 2024.04.17 |
| 이도형 장편소설 <국회의원 이방원>(북레시피) (0) | 2024.04.16 |
| 김나현 소설집 <래빗 인 더 홀>(자음과모음) (0) | 2024.04.16 |



